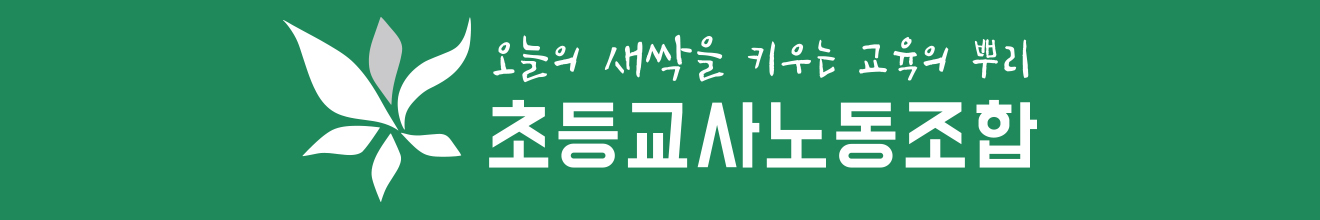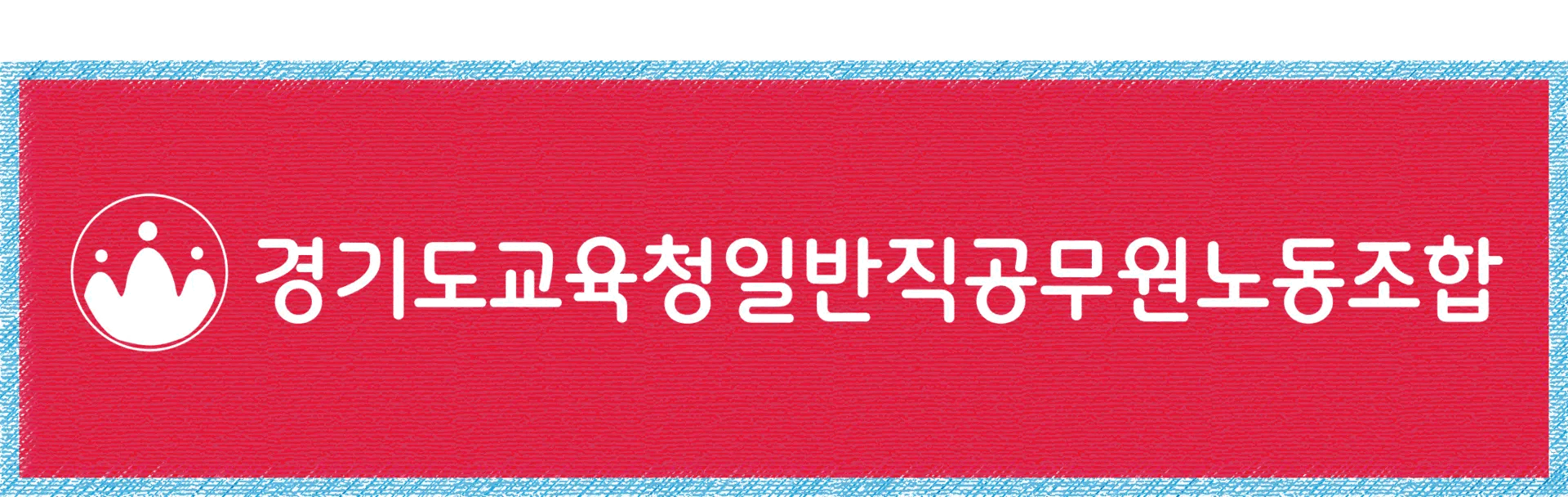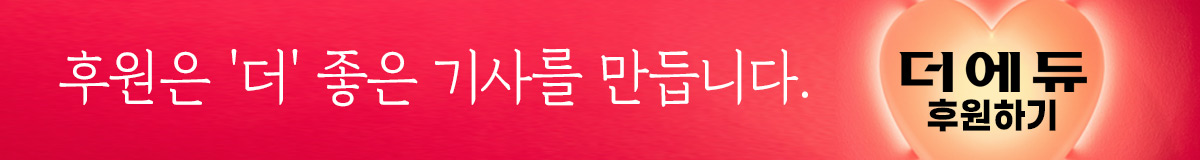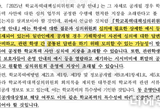더에듀 |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줄을 서라는 교사의 말에 초등학생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되묻는다. 순간 교사는 말문이 막힌다. 어른의 지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풍경, 지금 교실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면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유를 배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빠진 자유다. 교사의 말은 권위가 아니라 선택적 조언이 되고, 규칙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약속처럼 여겨진다.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고, 꾸중은 감정적 대응으로 몰리며,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까지 왜곡되기도 한다. 결국 교사는 침묵을 택한다. 그 침묵은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 익숙해진 아이는 갈등 상황에서 늘 자기 기분을 앞세운다. 권리는 강조하면서도,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모습을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이 예민해진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훈육 없는 성장, 경계 없는 관계, 감정을 최우선에 둔 교육이 만들어 낸 시대적 산물이다.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서와 책임의 언어를 듣지 못한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분명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공동체를 해친다.
아이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늘 피해자 위치에 서고, 타인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세계에 살게 된다. 그런 세계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고,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가 흔들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지식보다 태도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알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성’이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다.
교사의 말이 다시 힘을 가지려면, 사회가 먼저 교사를 신뢰해야 한다. 훈육하는 교사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려는 시도를 격려할 때 비로소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 된다.
자유는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그 가르침이 없는 자유는 결코 아이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태도는 능력이다. 자유는 본능이지만, 책임은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