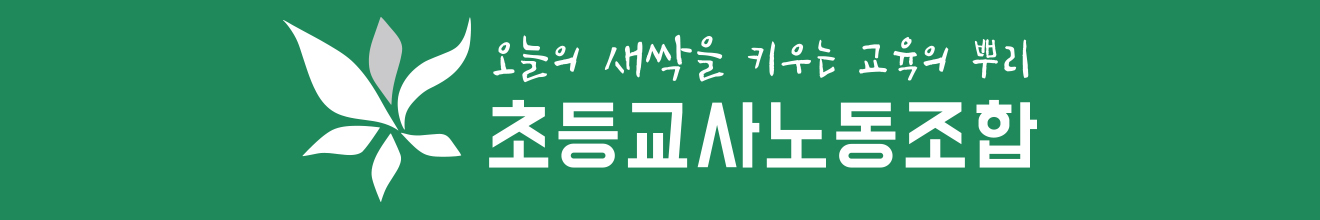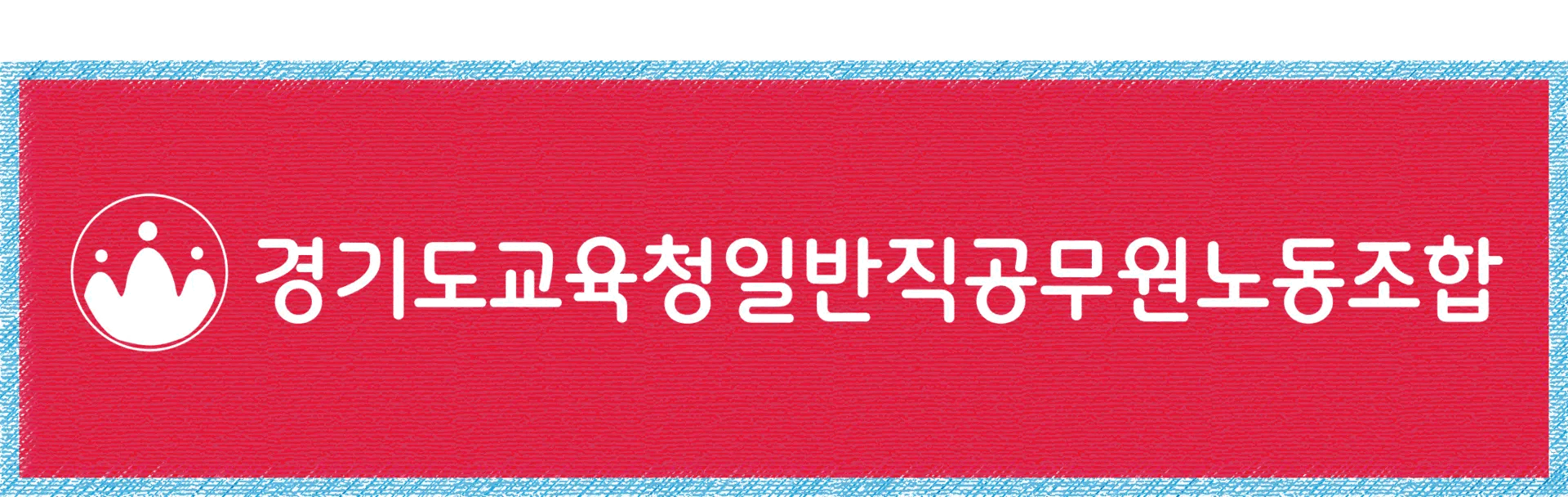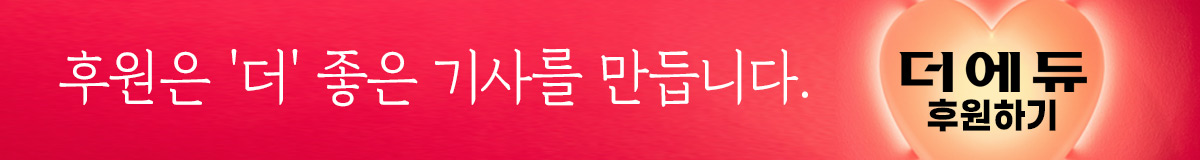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

지난 회에 이어 스크린 타임에 대해 조금만 더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언론과 장삿속으로 스크린 타임에 대한 공포가 과장된 부분은 있다고 해도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근시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태도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악영향의 정도나 과도하다는 기준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한 수면 부족을 야기하는 밤늦은 공부는 독려하고 있다니 참 모순적인 일이다
전문가들은 다 알 텐데도 형설지공이니 주경야독이니 하면서 야밤의 공부를 미덕으로 삼은 우리 문화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밤늦게 공부시킨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게 아니라 정신 질환과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부족이 뇌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를 하나 읽어볼까 한다. 그간 살폈던 논문보다 뇌과학 분야의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없는 필자로서는 상세한 방법론과 분석값보다는 결론 위주로 살펴보겠다.
수면 부족이 뇌인지 발달에 끼치는 악영향 살핀 종단 연구
그렇게 함께 읽을 논문은 판 닐스 양 메릴랜드대 박사후 연구원, 웨이전 셰 미국국립보건원 연구원, 쩌 왕 메릴랜드대 교수가 2022년 랜싯(Lancet) 아동·청소년 건강 저널에 게재한 ‘미국 초기 청소년의 뇌신경인지 발달에 대한 수면 시간의 영향: 성향 점수 기반 종단 관찰 연구(Effects of sleep duration on neurocognitive development in U.S. early adolescents: a propensity score matched,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이다.
수면 부족이 아동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장기간에 걸쳐 살펴본 연구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연구는 제목의 ‘관찰 연구’가 말해주듯, 이 연구는 직접 실험을 한 연구가 아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난 회에서 살펴본 연구에도 이용했던 미국 ‘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Study, ABCD Study)’의 2021년 공개분인 3.0판 데이터이다.
ABCD 연구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유는 미국의 아동 뇌 발달에 관한 최대 규모 장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분명하게 입증되는 연구 결과를 선호하는 데다 뇌 발달에 관심이 많은 영향도 없진 않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9~10세 아동 1만 1878명의 뇌와 행동 데이터를 시작으로, 1년 후, 2년 후 결과까지 살폈다. 사례는 미국의 다양한 인구 특정을 고려해 층화표집으로 선정했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을 먼저 중복되지 않도록 나눈 다음 각 집단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여러 조건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충실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8323명의 데이터가 이용됐다.
우리나라 초등생 평균보다 많은 9시간 기준으로 수면 부족 분류
독립 변인인 수면 시간은 부모의 ‘아동 수면장애 척도(Sleep Disturbance Scale for Children)’ 응답을 기준으로 해 9시간 미만 수면 아동을 수면 부족 그룹으로 보고 9시간 이상인 아동과 비교했다.
9시간이라는 기준은 미국 수면 재단의 권장 수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이다. 이 정도면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면 수면 부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슷한 연령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보다 적은 8시간 41분이다. 평균이 수면 부족 수준이다.
아무튼, 이에 따른 종속 변인은 행동 문제, 인지, 정신 건강, 뇌 측정 결과를 살펴봤다. 행동 문제를 측정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소개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사용했다. 그외 자세한 측정 방법과 분석 방법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겠다.
수면 부족은 행동, 인지, 정신 건강 모두에 장기적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수면 충분 그룹도 해마다 수면 부족 아동이 늘어나긴 했지만, 동물 연구에서 수면 부족의 뇌인지 기능에 대한 영향이 누적되고 심지어 비가역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작점에서 수면 부족 아동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룹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면 부족 그룹 아동의 수면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부족한 상태를 유지했다.

수면 부족의 영향은 행동 문제 20개, 인지 기능 10개, 정신 건강 12개 척도와 관련해 확인했다. 42개 척도 중 32개 척도에 대해 시작점부터 확실한 차이가 났다. 특히 우울증, 사고 문제, 그림 어휘 검사 수행 능력, 그리고 학습된 지식을 중심으로 측정되는 결정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 네 가지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2년 차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관이 크게 나타나 청소년의 행동 문제, 뇌 인지,수면 부족이 장기간에 걸쳐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면 부족 → 뇌의 기능 조직, 구조 발달 → 행동 문제
이어 뇌 네트워크의 내재적 기능 조직이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306개의 고유한 기능 연결 중 93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은 기저핵에 있었으며, 2년 차에도 그 차이가 유지됐다. 연구진은 이를 뇌 구조의 내재적 기능 조직 중 특정한 기능 연결이 수면 부족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뇌 영상으로 분석한 뇌 구조 발달에서도 184개 영역 중 12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는 2년 차에도 유지됐다. 대뇌 피질 영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지만, 피질 두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수면 유형과 행동 간의 관계를 뇌 측정 결과가 어떻게 매개하는지 밝히기 위해 영역별로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뇌 측정 지표들이 앞서 큰 차이가 난 네 가지 행동 지표(우울증, 사고 문제, 그림 어휘 검사 수행 능력, 결정 지능)의 차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특히 그림 어휘 검사 수행 능력과 결정 지능에 대한 수면 부족의 효과는 뇌 기능과 구조의 차이가 확실하게 매개하고 있었다. 휴식 상태 기능 연결성(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즉 피험자가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에서 뇌의 여러 영역 간 활동이 얼마나 동기화돼 있는지 분석하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측정치 5가지 중 3가지는 우울증과 사고 문제에 대한 영향도 매개하고 있었다.
이런 관찰의 견고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매개 분석을 했고 뇌의 기능적 구조적 차이 중 일부가 사고 문제, 그림 어휘 검사 수행 능력, 결정 지능에 견고하게 수면 부족의 영향을 매개하고 있었다.
주의력 저하 등 뇌에 장기적 장애 가져오는 ‘손상’ 끼쳐
사실 수면 부족이 뇌에, 정신 건강에,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이미 북미에서는 수면 부족이 발달에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길 정도로 많다.
이 연구의 의미는 수면 부족이 이런저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라 수면 부족이 끼치는 영향이 이뤄지는 기제를 뇌 구조 발달과 기능이 매개하는 부분 중 그동안 분석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통해 분석했다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필자 같은 문외한들에게 그런 내용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이 연구를 힘겹게 읽은 것은 만성 수면 부족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입증했고, 이것이 뇌인지 발달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 여러 연구 중 비교적 최신 연구라서가 한 가지 이유이다.

특히 이들이 전두엽과 함께 청소년기 동안 뇌에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겪는 대뇌 기저핵이 바로 수면 부족과 행동 문제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은 중고생들에게 밤늦은 공부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구진은 논의를 통해 수면 부족이 도파민이나 아데노신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기저핵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대뇌피질-기저핵-시상-대뇌피질 회로를 손상해 주의력 약화와 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인지·정서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순히 수면이 부족해 당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로 대뇌피질과 기저핵 간의 연결 손상이 최소한 2년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잠 줄여가며 공부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또한, 이번 연구가 수면 부족이 결정 지능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을 밝혔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수면 부족의 지능에 대한 영향이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번 연구로 그 애매함이 해소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유동 지능이 아닌 학습된 지식에 의존하는 결정 지능 부분에만 영향이 크고 이번 매개 분석을 통해서 수면 부족이 이렇게 결정 지능에 영향을 끼치는 기제가 구조화된 지식의 표상과 인출을 담당하는 핵심 뇌신경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만성적 수면 부족일 정도로 매일 잠을 줄여 가며 공부한다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부를 더 못하게 됨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진은 수면 부족이 청소년기 뇌에서 측두엽의 성숙을 지연시켜 기억 공고화를 방해할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억 공고화는 교육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학습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만성 수면 부족인 학생은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이 역시 좀 더 자극적으로 바꿔 말하면, 잠을 줄여 공부한 결과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져 오래 기억하는 내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다른 의의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면 부족과 수면 충분 그룹 간의 차이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사춘기 정도, 도시화 정도 등은 이런 수면 부족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주의력 저하 뿐 아니라 충동성 증가도
여기까지가 이번에 함께 읽을 논문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고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연구의 연구진인 양 연구원과 왕 교수가 더 최근에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 ADHD의 한 지표인 충동성에 초점을 맞춰 수면 부족이 영향을 끼치는 기제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 논문을 먼저 접했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겉만 핥아 그래도 읽을 만한 이 논문을 고른 것이다. 사실 앞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독자는 이번 논문의 논의 부분에서도 ‘주의력 저하’를 꼽았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물론 충동성이 높고 주의력 결핍이 있다고 다 ADHD는 아니다. ADHD는 꽤 많은 지표를 일관성 있게 충족해야 진단이 되는 장애이며, 요즘 ADHD가 갑자기 늘어났을 가능성보다는 진단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ADHD 등 뇌신경 발달 장애는 기본적으로 유전 소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의력 저하와 충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미 유전 소인을 갖고 있는 아동의 증상 발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도 무리한 상상은 아니다.
게다가 이것도 그냥 나온 상상은 아니다. 수면 부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행동 문제 심화에 영향이 있다는 모나쉬대의 연구도 봤기 때문에 해보게 되는 상상이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ADHD의 증세에 수면 부족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제목도 여럿 보긴 했다.
낭설은 경계해야 하지만, 수면 부족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
그래도 수면이 부족 때문에 ADHD가 생길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 타임 때문에 ADHD가 생긴다는 낭설이 안 그래도 돌아다니는 마당에 또 다른 낭설을 얹을 생각은 없다.
다만, 수면 부족이 뇌에 끼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연구들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은데다 이번 연구에서 봤듯이 뇌 영상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밤늦은 공부를 권하기 전에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서 수면 부족이 이렇게 위험하니 과도한 스크린 타임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차피 과도한 스크린 타임은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다.
다만, 적어도 스크린 타임 걱정하는 만큼 수면 부족 걱정을 하는 균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부모이자 주말 취미가 논문인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논문을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