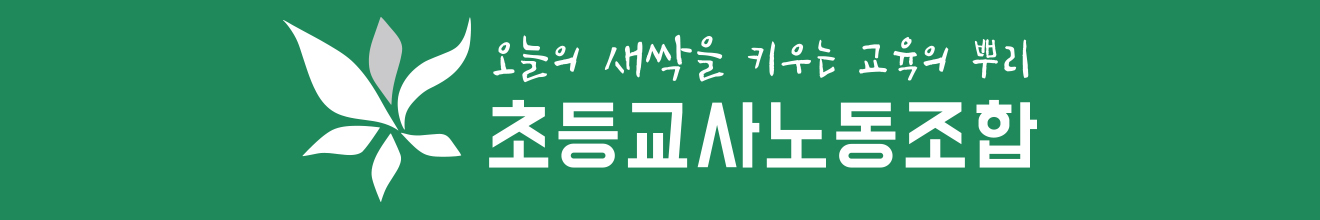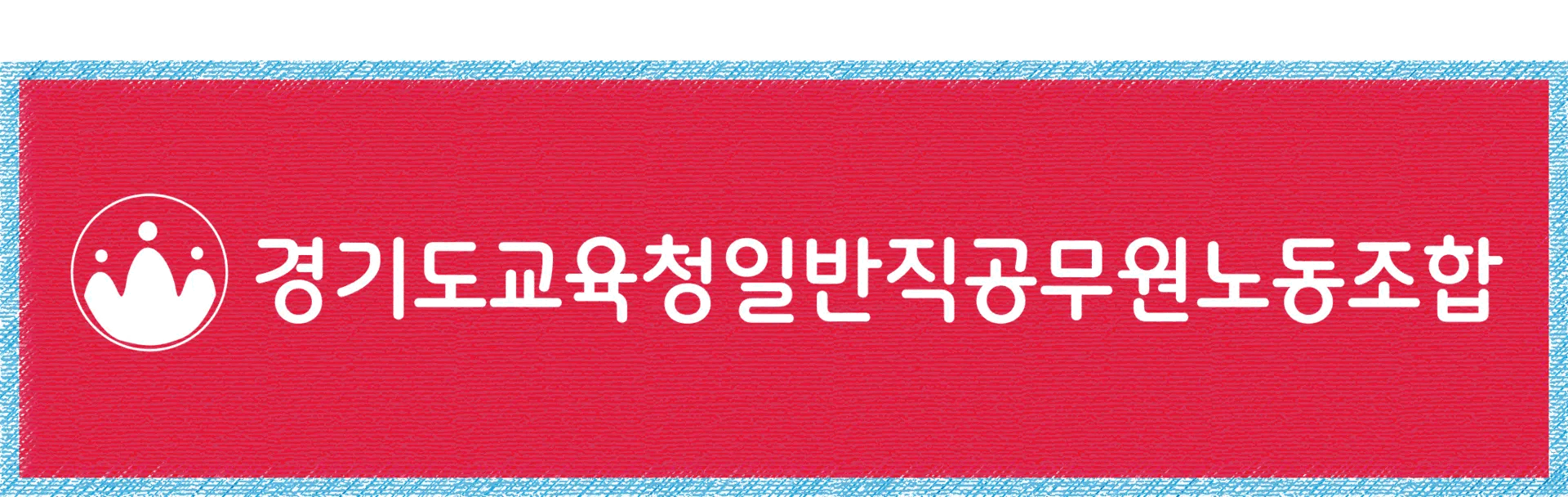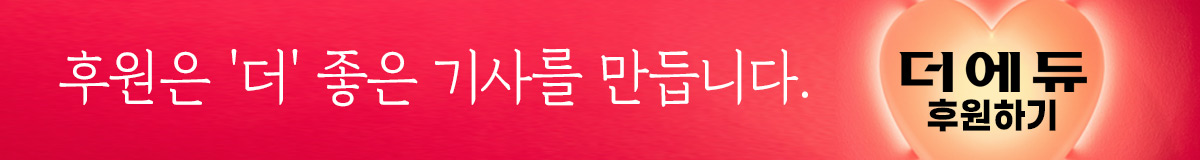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진짜' 이유보다 중요한 '가짜' 이유
필자는 최근 매주 가족과 함께 ‘이혼 숙려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부부간, 갈등을 다루며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부부 갈등’이나 ‘이혼’을 떠올리면 흔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이혼’은 법적인 절차와 관련되고, ‘옳고 그름’에 따른 귀책 사유를 따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문제인 만큼 ‘옳고 그름’보다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귀책을 논하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집중한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매력적인 이유이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여기에 출연하는 뛰어난 상담사들이다. 그들은 부부의 상태에 따라 온화하게 위로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다그치기도 한다.
내담자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국, 내담자와 시청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문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학대가, 어떤 이는 학교 폭력이, 그리고 배우자가 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결핍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톡’ 하고 건드리면, 어떤 내담자든 이내 눈물을 흘리며 무장 해제되고 만다.
그런데 필자는 문득 ‘혹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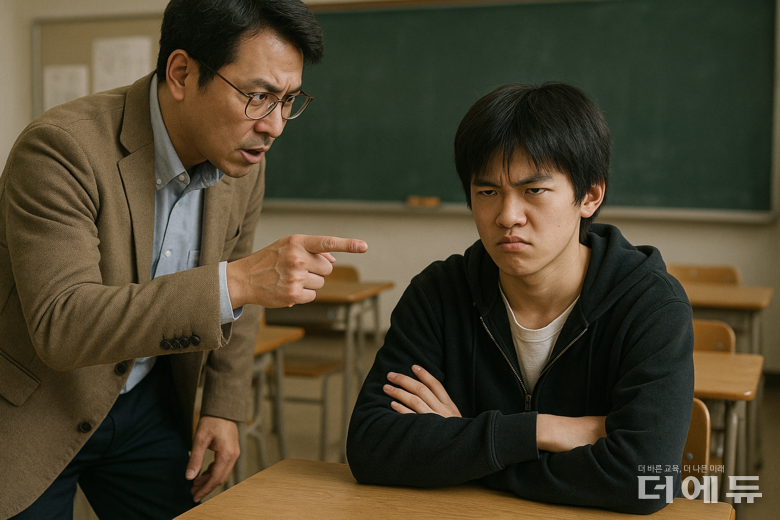
정말 그것이 원인일까?
필자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필자는 해산물을 거의 먹지 못한다. 그 비린내가 너무 역겨워 먹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 7살 때까지만 해도 고등어 살점을 밥 위에 올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필자가 아마 6살쯤이었을까. 밥상 위에 올라온 생선구이의 비린내를 핑계 삼아 울며 떼를 썼다.
실제로 비린내가 역겨웠던 것은 아니었다. 기분이 언짢았는지 그냥 밥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다. 이후 마치 그 비린내가 진짜였던 것처럼, 필자는 생선구이부터 시작해 국에 들어간 황태, 나중에는 조개류까지 역겹다며 안 먹기 시작했다. 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자, 필자는 해산물을 먹으면 진짜로 역함을 느끼게 되어 버렸다.
정말 허술하고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필자가 가진 많은 특성은 이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형성되어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유사한 경우를 자주 만난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 안에 뿌리내리는 경우이다.
때때로 학생들은 궁지에 몰리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소한 피해 경험이 과장된 형태일 수도 있다.
신기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말 자신이 저지른 문제 행동의 ‘진짜’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분명히 나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학생이 겪는 문제 행동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에 기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생들은 어른이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 없이도 문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속 상담사처럼 과거의 원인을 찾는 방식은 무의미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는 단순히 잘못된 원인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본연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상담사는 내담자가 지나치게 궁지에 몰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핑계’를 만들어 주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지닌 다양한 결핍과 문제가 단순히 외부의 탓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낸 내면의 서사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부부 갈등이나 학생의 문제 행동 이면에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 원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귀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부족함을 감싸 안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짜’ 이유를 찾으려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교사의 고집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때로는 진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가짜’ 이유를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진정한 교사라면 진실을 억지로 들춰내기보다는 학생이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할 테니 말이다.
정말, 교사라는 직업은 쉽지 않다.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