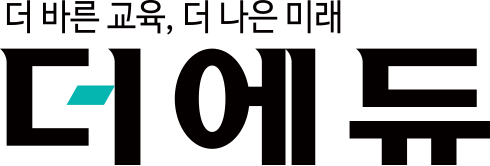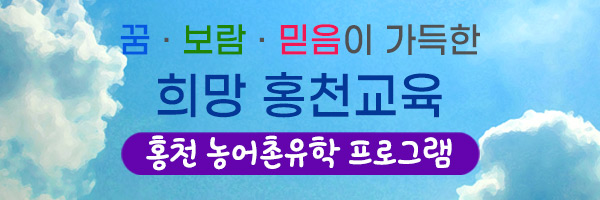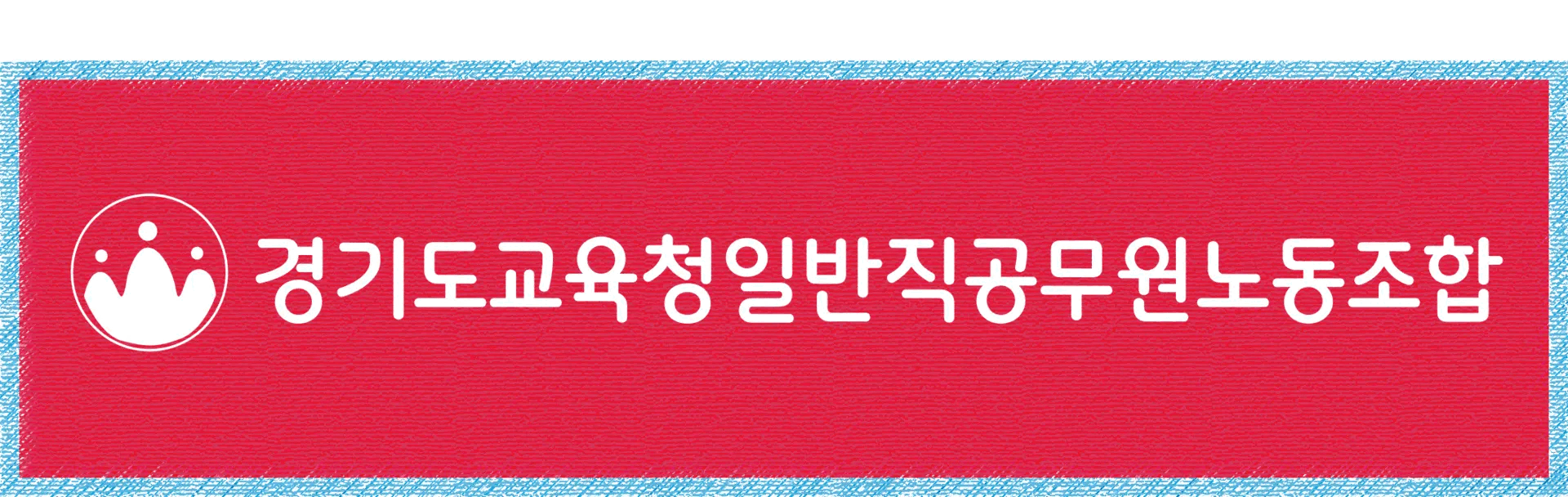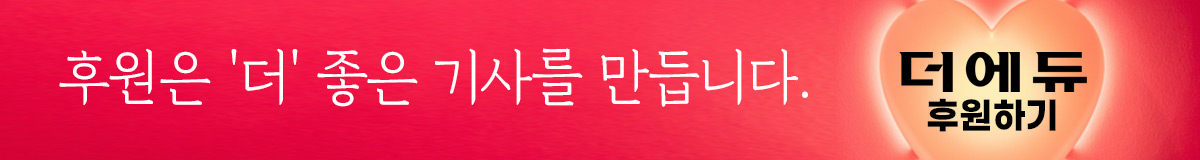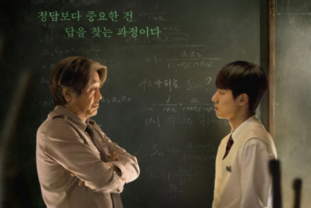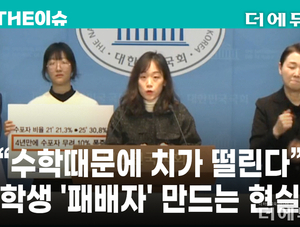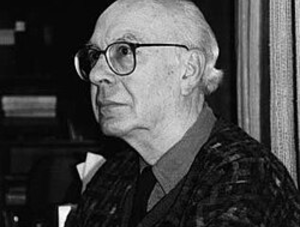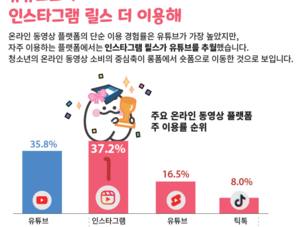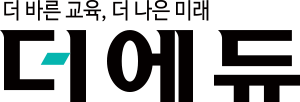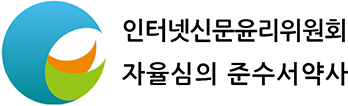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022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출범했다.
당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위원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결국 당시 여야는 중재안을 수용해 국교위법을 통과시켰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교위는 잘 운영되었을까. 평가는 냉혹했다. 양 극단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합의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어 그 흔한 홈페이지도 없이 시작하면서 회의록 미기재 문제까지 맞닥뜨렸다.
또 윤석열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뒷짐 지고 바라보면서 국교위 역할에 의문이 던져졌다. 특히 교원단체 추천권은 갈등 속에서 반쪽만 행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출마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하는 아쉬움까지 남겼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국교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진보 성향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 내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은 이후 토론회를 열고 국교위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초 정치색이 강한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합의제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못했다는 걸 핵심 문제로 꼽는다.
그럼에도 국교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그만큼 첨예한 정치현실에 대응해 안정감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교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에듀>는 지난 2월 국교위 준비 시부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당시 교수)를 만나 국교위가 맞닥뜨린 현실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