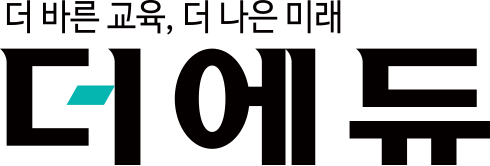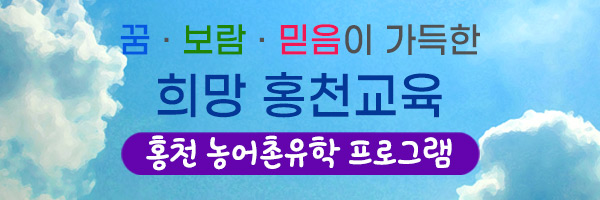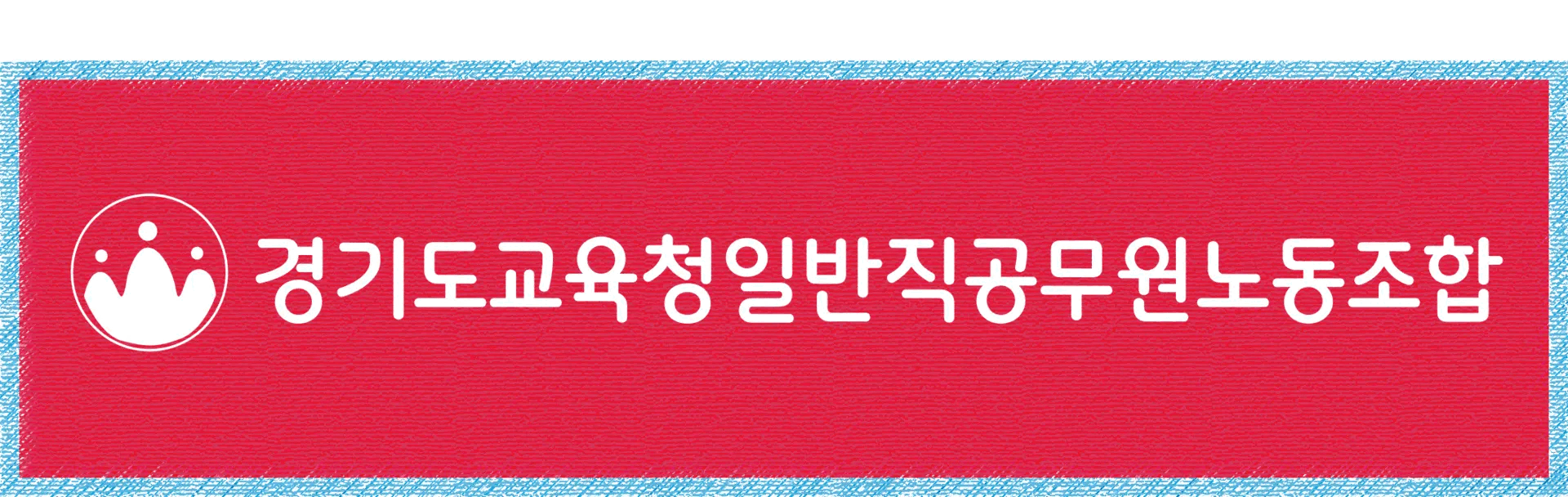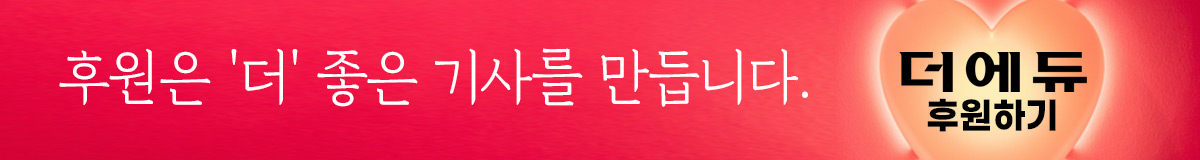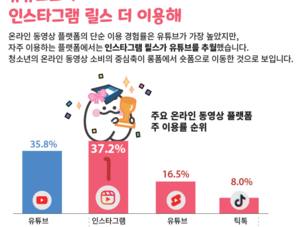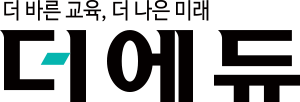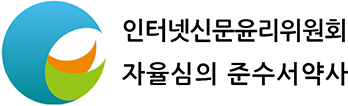더에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 학생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탐구 응시생 중 약 77%가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반대로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학생은 20%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현상은 단순히 과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육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학생들의 진로 의식, 대학입시 제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학생 각자가 가진 흥미·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탐구 선택권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신호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되짚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실질적 사례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우선 세 가지 주요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시에서의 ‘등급 경쟁’이 과목 선택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에게 사회탐구 과목은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공계 희망자마저도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탐런’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 문과·이과의 전통적 구분이 여전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과 = 과학탐구 선택’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한 가운데, 과탐 선택의 부담감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쉽고 안전한’ 사회탐구로 몰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셋째, 학교 현장의 진로·과목 선택 지도 및 대학입시 선발 방식이 이러한 편향성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과탐을 선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등급 하락, 최저기준 미충족 등)이 사회탐구 쏠림을 유도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등급 확보’와 ‘위험 회피’, 그리고 입시 구조가 과목 선택을 지배하는 풍토가 형성된 것이 문제이다.

극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안과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과목 선택 문화의 변화이다.
학교 현장에서 먼저 ‘이과 = 과탐, 문과 = 사탐’이라는 구도를 허물어야 한다.
예컨대 한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진로탐색 시간에 과탐을 ‘실험·탐구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이 과탐이 단순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흥미를 자극하고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었고, 그 결과 다음 학년 과탐 선택률이 의미 있게 증가한 사례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과학기술·공학·융합 분야에 흥미가 있다면 과탐을 두려워 말자”고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캠페인과 멘토링이 필요하다.
둘째, 입시제도 및 대학전형의 구조 개선이다.
입시 기관과 대학은 탐구 과목 선택이 학생의 적성과 미래진로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과탐 과목을 선택한 학생도 충분히 입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탐 반영 가산점’ 혹은 ‘과탐 선택 권장 제도’로 유도하거나, 탐구 영역의 과목별 난이도·등급 구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들이 모집 요강에서 ‘탐구 선택 과목 제한’을 완화하거나, 사탐·과탐 모두에서 학생이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게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과목 선택 지도 강화이다.
학교 현장의 진로지도 교사 및 상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적성검사, 학습 성향, 진로 희망 분야를 바탕으로 ‘탐구 과목 선택 워크숍’을 갖고, 졸업생이나 현업 종사자를 초청한 ‘과탐 선택 경험담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생들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실제 사례를 통해 과탐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어느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과탐 선택자는 이후 공학계열·의공학·ICT융합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는 졸업생 인터뷰를 영상화해 1학년 때부터 과탐 선택의 동기를 고취시켰고, 해당 학교 과탐 이탈률이 낮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
정책 목표, 내 길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는 이 기형적 쏠림을 단순히 통계치로만 보고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교육 체계가 그 가능성을 넉넉히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라 할 수 있다.
문과·이과라는 오랜 관행의 칸막이도, 입시 관행도, ‘등급 경쟁’이라는 짐도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교육 현장과 정책은 학생들이 ‘내 길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고, 각자 가진 적성·흥미에 맞게 탐구과목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탐 과다 선택 문제는 단순히 과목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하는 교육의 기회로 바뀔 것이라 믿는다.